Premium Only Content

동경대전 2, 도올김용옥, 동학론, 포덕문, 최수운, 축문, 주문, 조선, 최제우, 천제, 천도교, 비어, 강결, 우음, 팔절, 제서, 필법, 유고음, 우음, 통문, 통유, 사식
동경대전東經大全 제의題義 11
내가 역해하는 〈동경대전〉 텍스트에 관하여 15
Ⅰ 포덕문布德文 18
Ⅱ 동학론東學論(논학문論學文) 102
Ⅲ 수덕문修德文 154
Ⅳ 불연기연不然其然 192
Ⅴ 축문祝文 210
Ⅵ 주문呪文 214
Ⅶ 입춘시立春詩 220
Ⅷ 절구絶句 224
Ⅸ 항시降詩 228
Ⅹ 좌잠座箴 230
ⅩⅠ 화결시和訣詩 236
ⅩⅡ 탄도유심급歎道儒心急 250
ⅩⅢ 강결降訣 270
ⅩⅣ 우음偶吟 274
ⅩⅤ 팔절八節 286
ⅩⅥ 제서題書 294
ⅩⅦ 영소?宵 297
ⅩⅧ 필법筆法 306
ⅩⅨ 유고음流高吟 318
ⅩⅩ 우음偶吟2 321
ⅩⅩⅠ 통문通文 324
ⅩⅩⅡ 통유通諭 330
ⅩⅩⅢ 사식四式 340
ⅩⅩⅣ 해월발문海月跋文 348
ⅩⅩⅤ 검결劍訣 356
ⅩⅩⅥ 필송畢頌 362
【동학연표】 366
동학연표 참고문헌 537
〈용담유사〉 계미중추북접신간 567~540
찾아보기 568
책 속으로
제2권
“동경대전”이라는 책제목은 1880년 6월 14일 인제 남면 갑둔리에서 처음 간행될 때 동학의 경전을 다 모아 상재한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인데 원래는 문집의 체제로 기획되었던 것이다. (11)
경진초판본은 수운이 필사한 수고본手稿本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상의 모든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16)
수운은 자신의 포덕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1861년 7월 중순경에 지은 글이 바로 〈동경대전〉의 서두를 장식케 된 이 포덕문이다. (23)
수운은 “선·후천개벽”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수운이 활약한 1850·60년대에 조선땅의 사상가들의 의식세계에 자리잡지 않은 생소한 단어들이었다. (33)
중국인들에게도 “선·후천개벽”이라는 말은 의미를 갖지 않는 자형의 조합일 뿐이다. 이 말은 오로지 조선의 민중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 우리 민중의 언어 (40)
수운에게 있어서는 “개벽”과 “다시개벽”밖에는 없다. (47)
“다시개벽”은 그의 “보국안민” 의식과 관련된 그의 삶의 체험이 명령하는 당위성 (48)
종교와 관련된 서구역사의 제국주의적 실상을 이토록 처절하고 적나라하게 폭로한 논리를 억압받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75)
수운에게 있어서 “천주”는 서학의 “천주”가 아니라, 상제上帝를 극복하고 자기 내면화된 “하느님”의 단순한 한문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85)
이 편의 이름은 “논학문論學文”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도원기서〉나 〈대선생주문집〉과 같은 초기기록에 이 경문은 “동학론”으로 나온다. 경진초판본에 이 두 번째 경문이 “동학론”으로 되어있어, … 그렇다면 언제 누가 “동학론”을 “논학문”으로 고쳤을까? (102)
“선생님, 하느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인간세상에 선과 악이 있고 인간의 행위가 그토록 부도덕할 수가 있습니까?” 〈동학론〉 (142)
불연의 세계는 불가사의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초월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인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식의 확충에 따라 불가사의는 가사의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205)
나의 도는 너르고 너르지만 간략하기 그지없다. … 오직 성(우주적 성실성)·경(진지함과 집중력)·신(거짓
없음), 이 세 글자에 있다. 〈좌잠〉 (230)
수운의 〈필법筆法〉이라는 12자 8행의 짧은 시에, … “삼절三絶”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근 160년 동안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307)
-
 13:22
13:22
Silver Dragons
17 hours agoAre You Prepared for What SILVER Will Do Next?
8953 -
 9:20
9:20
Adam Does Movies
19 hours ago $0.10 earnedIT: Welcome To Derry Episode 4 Recap - What An Eyesore
2481 -
 LIVE
LIVE
LIVE WITH CHRIS'WORLD
11 hours agoTHE WAKE UP CALL - 11/24/2025 - Episode 12
308 watching -
 LIVE
LIVE
BEK TV
2 days agoTrent Loos in the Morning - 11/24/2025
158 watching -
 LIVE
LIVE
The Bubba Army
2 days agoF1'S NEWEST DRIVER? - Bubba the Love Sponge® Show | 11/24/25
1,483 watching -
 19:15
19:15
Nikko Ortiz
20 hours agoOstrich Gets A Taste For Human Blood
55.2K16 -
 32:42
32:42
MetatronHistory
1 day agoWas FASCISM Left wing or Right wing?
9.01K37 -
 LIVE
LIVE
Flex011
5 hours ago $0.01 earnedFrom Scrap to Stronghold: Our Base is Live!
78 watching -
 9:52
9:52
MattMorseTV
14 hours ago $15.43 earnedTrump just GAVE the ORDER.
18.7K5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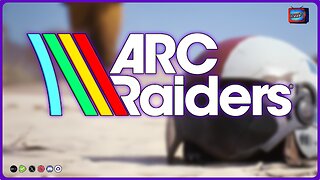 LIVE
LIVE
PudgeTV
1 hour ago🟣 Arc Raiders - Gaming on Rumble | Monday Madness
47 watc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