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Only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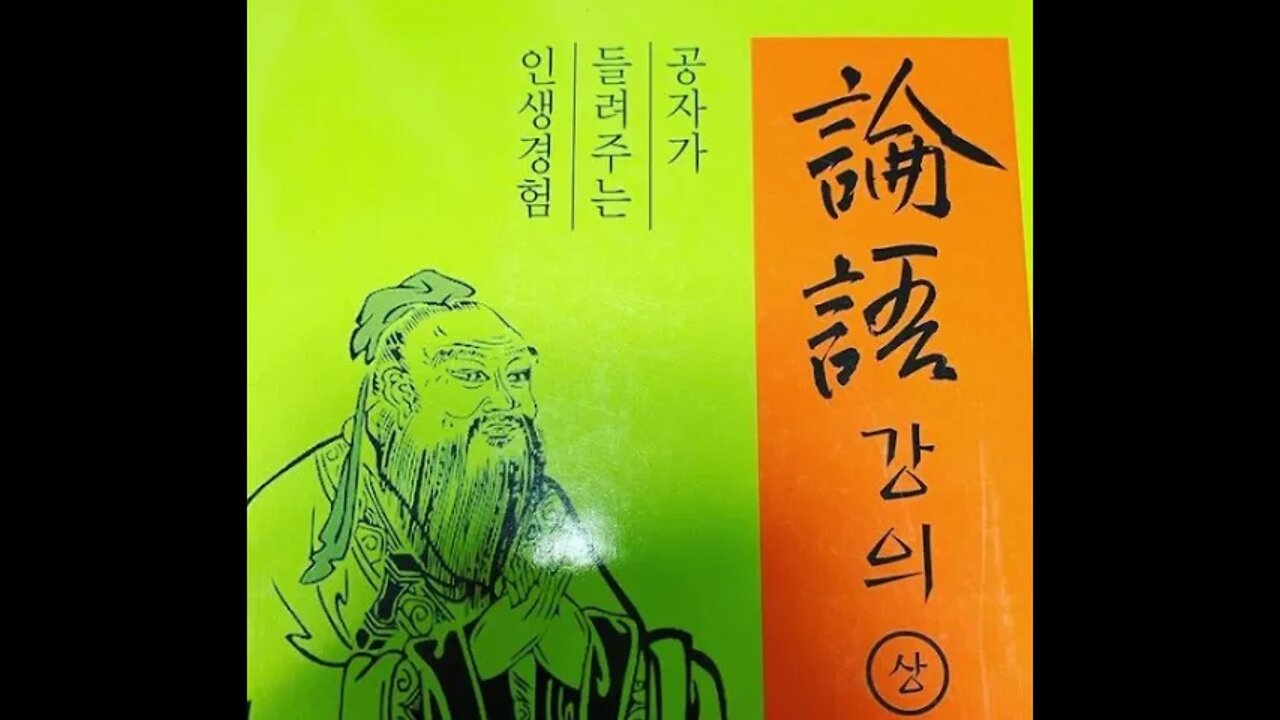
남회근, 논어강의, 공자, 자공, 자로, 안연, 사기, 사마천, 득의망형, 빈이무첨, 부이무교, 빈이락호예, 단목사, 유상, 부귀, 가난, 교만, 예를 좋아함, 중니, 아첨, 안회
남회근, 논어강의, 공자, 자공, 자로, 안연, 사기, 사마천, 득의망형, 빈이무첨, 부이무교, 빈이락호예, 단목사, 유상, 부귀, 가난, 교만, 예를 좋아함, 중니, 아첨, 안회
이 책은 논어로 논어를 풀이함으로써 지난 2천년 동안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가 담긴 책이다. 동서고금과 유불도 제자백가를 넘나드는 흥미진진항 강해를 들려주며, 이를 통해 현대인들로 하여금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어 준다.
목차
강의를 시작하며
제1편 학이 學而
제2편 위정 爲政
제3편 팔일 八佾
제4편 이인 里仁
제5편 공야장 公冶長
제6편 옹야 雍也
제7편 술이 述而
제8편 태백 泰伯
제9편 자한 子罕
저자 소개
저자 : 남희근
1918년 중국 절강성에서 태어났다. 서당식 교육을 받아 사서오경 제자백가를 어릴 적부터 공부하였다. 정강성성립국술원에서 문학 서예 의학 역학 천문학을 배우고 1937년 졸업했다. 중앙군관학교 교관을 거쳐 금릉대학에서사회학을 연구했다. 25세 때 원환선 선생이 창립한 유마정사에 합류하여 제자가 되었다. 대평사에서 수행하며 팔만대장경을 완독하고 티베트 밀교 고승으로부터 사사받았다
지금 삶이 힘들고 형편이 궁하다면 공자를 롤모델로 삼아보자.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와 더불어 사대성인에 속하는 공자는 궁한 생활과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공자가 제시한 고난 극복의 법은 사변적이고 허무맹랑한 말장난이 아니라 일상적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과 연대를 실천하는 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자는 가장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불멸의 사상가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자는 진정한 인간이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최고의 인문주의자였다.
공자는 위대한 패배자였다. '상갓집 개'처럼 철저히 비주류로 살아갔고 자신의 이상정치를 현실에 펼치지 못했다. 무릇 학문을 추구하는 것은 정치를 통해 뜻을 펼치기 위해서다. 주백려의 치가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과거에는 책을 읽는 뜻은 성현이 되고자 함에 있고, 관리가 되려는 마음은 임금과 나라에 충성하고자 함에 있다."(讀書志在聖賢, 為官心存君國). 그러나 패도에 길들여진 제후들은 공자의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현명한 제후가 공자를 받아들여 그 도를 펼치게 했다면 '논어'라는 고전은 영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감히 공자 개인의 실패는 만인의 성공을 키우는 기름진 토양이 되었고, 공자 개인의 정치적 좌절은 만세에 길이 남을 사상적 축복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결국, 공자의 삶은 성공과 실패라는 단순한 척도를 넘어선 '위대한 삶'이었다.
산과 같은 사랑과 물과 같은 지혜를 구비한 성인이 바로 공자이다. 공자의 어록을 담은 '논어'는 공자의 인간다움과 자기실현의 과정을 매우 솔직하게 보여준다. 공자의 지혜와 유머, 편견과 아집, 희망과 기쁨, 분노와 슬픔, 쓸데없는 자존심과 탄식 등이 그대로 실려 있다. 다들 '학이'나 '위정'과 같은 논어의 편명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해보았는지 궁금하다. 각 편명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논어'는 '학이'에서 시작하여 '지인'으로 갈무리한다. 리영희 선생의 탁견처럼, 논어 20편이 합치면 학이지인. 곧 '배워서 사람됨을 알라'는 가르침이다. 훗날 사람들은 공자에게 '대성지성선사'라는 칭호를 붙였지만, 공자는 말 그대로 평생 '학인', 즉 끝없이 배우는 사람이었고 사람다움을 배우는 휴머니스트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논어'는 평생 인문주의자로 살아가는 삶의 나침반을 제시하는 고전이다. 수제자인 자공은 공자의 덕을 형용하면서 이를 온(溫), 량(良), 공(恭), 검(儉), 양(讓)으로 정리한 바 있다. 실제로 논어를 읽다 보면 공자의 말이 비록 평이하지만, 그 뜻이 무척 심원하고 그 태도가 점잖고 우아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논어'는 인문주의자가 지향해야 할 삶의 길을 제시한 고전이다. 공자는 수기치인(修己治人)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었다. 어떻게 자신의 내적 학문과 수양을 충실히 해서 성현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대업에 종사할 것인지 가르쳐 준 것이다. 공자의 인문주의는 시·서·예·악을 아우르고 문·행·충·신 네 가지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런 공자의 가르침은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공리공담과 거리가 매우 멀다. 공자의 가르침은 사람이 일상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도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하학(下學)의 일 아님이 없다. 그래서 17세기 일본의 유학자 이토 진사이는 '논어'를 '최상지극우주제일의 책'이라 극찬했고, '일본 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치는 '논어'를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조화를 이룬 수신의 자기계발서이자 실용적인 경제경영서로 간주했다.
이 책의 원제는 '논어별재'다. 1976년 대만에서 출판된 책이지만 여전히 논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나침반 같은 교양서다. 남회근 선생은 '논어'가 수미일관된 한 편의 대문장이라고 주장한다. 논어를 각각 상론과 하론 10편씩으로 나누어 강의하되, 상론의 제10편인 향당편은 제20편 요왈편 다음에 두어 논어의 총결론으로 삼고 있다. 고전의 맛은 무엇보다도 번역이 좌우한다. 번역이 해석이고 의미이고 맛을 결정한다. 이런 논어의 맛은 읽는 이의 연륜과 경험, 읽는 당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맛이 각각 다르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논어의 일반적인 해석, 즉 송대 유학자나 서당 훈장의 해석과 남회근 선생의 독창적인 해석을 모두 맛볼 수 있다.
-
 2:05:43
2:05:43
LFA TV
21 hours agoRUMBLE RUNDOWN WEEK 7 with SHAWN FARASH 11.22.25 9AM
139K7 -
 LIVE
LIVE
ttvglamourx
2 hours ago $0.60 earnedGLAMOURX VS CALL OF DUTY LOBBIES !DISCORD
135 watching -
 LIVE
LIVE
DannyStreams
4 hours agoSaturday Morning Tarky
66 watching -
 1:12:53
1:12:53
Wendy Bell Radio
7 hours agoPet Talk With The Pet Doc
30.5K20 -
 LIVE
LIVE
CHiLi XDD
2 hours agoFF7 Remake | Materia Hunting at its finest!
60 watchi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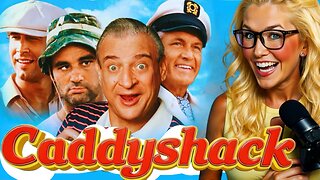 33:49
33:49
SouthernbelleReacts
21 hours ago $1.43 earnedNOT THE GOPHER 😭🤣 | First Time Watching Caddyshack
16K3 -
 26:19
26:19
marcushouse
5 hours ago $5.74 earnedStarship Super Heavy Just Blew Itself Apart! 🤯 What Happened Here!?
19.3K10 -
 29:27
29:27
JohnXSantos
21 hours ago $0.87 earnedHow To Start a CLOTHING BRAND on a BUDGET! ($100) Step X Step Guide
13.2K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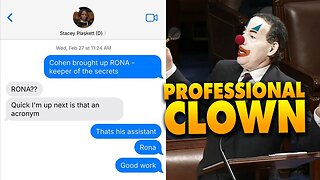 3:07
3:07
Memology 101
14 hours ago $3.30 earnedImagine having the AUDACITY to defend this SH*T...
16.6K18 -
 11:13
11:13
MattMorseTV
21 hours ago $57.25 earnedRINO PLOT just got SHUT DOWN.
66.8K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