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Only Content

이순신을 찾아서, 최원식, 단재 신채호, 수군제일위인 이순신, 충무공, 동국삼걸전, 을지문덕, 최영, 요동, 불세출의 영웅, 성웅, 임진조국전쟁, 구보박태원, 김지하, 김탁환불멸
이순신은 언제부터 ‘영웅’으로 존재했을까. 문학평론가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이순신 숭모는 근대적 현상이다. 대한제국이 위기에 빠진 20세기 초에는 국권 회복의 메타포였고,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해방의 상징, 그리고 광복 이후엔 국민국가 건설의 영웅이 됐다. 최 교수는 신간 ‘이순신을 찾아서’를 통해 이 같은 ‘충무공 숭배’의 원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간다.
책에 따르면 이런 경향을 제공한 건 단재 신채호의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이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은 나라와 백성에 충성하는 이순신의 면모를 부각시켰다. 이후 이순신은 중세적 충(忠)의 범위를 벗어나 국권 회복의 상징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단재가 ‘충무공 숭배’의 근원으로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책의 핵심이다. 저자는 단재의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의 집필 의도는 국민 하나하나가 ‘제2의 충무’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길 바랐을 뿐, 그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들려는 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순신을 성자의 위치에 올린 건 춘원 이광수였다. 저자는 춘원의 ‘이순신(1931∼1932)’에 대해 “허구도 아닌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이순신 소설화의 불행한 시작’으로 지목한다. “세상의 무식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홀로 밀고 나가는 이순신, 춘원이 창조한 이순신은 바로 춘원이니 참으로 지독한 자기애다.” 이 ‘자기애’가 춘원의 애독자였던 박정희에게 전이돼 광화문 충무공 동상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 결국 춘원에서 시작된 ‘영웅 이순신’은 박정희의 뜻을 받든 노산 이은상의 ‘성웅 이순신’을 거치며 단재를 가로막았고, 이후 이순신 서사를 지배하게 된다. 책은 김훈의 ‘칼의 노래’ 역시 이 같은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수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단재 이후 주목할 만한 ‘이순신 이야기’로는 구보 박태원의 ‘임진 조국전쟁’(1960)을 꼽는다. “구보 소설치고는 평범하다”고 하면서도 이순신의 개방성과 민중성을 강조한 구보의 뛰어난 안목을 칭송한다.
책은 단재와 춘원·구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순신을 분석한다. 김지하의 ‘구리 이순신’(1971), 김탁환의 ‘불멸’(1998), 김훈의 ‘칼의 노래’(2001) 등 충효의 상징, 고독한 허무주의자, 신파의 주인공 등 시대와 작가에 따라 탈역사화 혹은 해체되는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 376쪽, 2만 원.
문학평론가 최원식 인하대 명예교수가 충무공 이순신을 단재 신채호와 구보 박태원의 저작을 통해 살펴보는 책을 펴냈다.
단재 신채호는 이순신을 민족의 영웅으로, 국민의 영웅으로 처음 호출했다.
단재는 1908년 5월2일부터 8월18일까지 국한문판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한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을 통해 충무공을 국권 회복의 영웅으로 위상을 높인다.
소설가 구보 박태원은 해방 직후부터 이순신전을 여러 번 연재했으며 1960년 북한에서 출판한 '임진조국전쟁'이 그 종결판이다.
구보는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행록'을 1948년 '이충무공행록'이란 명칭으로 출판한다. '행록'은 모든 이순신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며 구보의 번역문장과 주석은 지금까지도 최고라고 평가 받는다.
저자 최원식은 단채의 '수군제일위인 이순신' 이후 충무공을 다룬 모든 책을 검토해 이순신 이야기의 변모 과정으로 살폈다.
책은 단재와 춘원·구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순신을 분석한다. 김지하의 '구리 이순신'(1971), 김탁환의 '불멸'(1998), 김훈의 '칼의 노래'(2001) 등 시대와 작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해체되는 인간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
저서 이순신을 찾아서(돌베개, 2020)은 전체 2부로 구성되었다. 1부 이순신 서사의 향방은 ‘해설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재의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을 축으로 이순신 서사의 내력을 비판적으로 개관하였다.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에 등장하는 이순신부터 김훈의 『칼의 노래』에 등장하는 이순신까지, 각각의 책에서 묘사된 이순신의 특징과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단재의 이순신의 차이점도 거듭 설명하고 있다.
2부 〈단재와 구보의 이순신〉은 ‘자료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재의 『수군제일위인 이순신』은 국한문체에 옛 고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간 제대로 된 원전 비평을 거치지 못해 텍스트나 번역이 좀 혼란스럽다. 이 책에서는 1908년 신문 연재본을 꼼꼼히 대조하고, 정확한 교주와 번역 작업을 거쳐 정본 텍스트를 확정하였다.
구보 박태원이 번역하고 주석을 단 『이충무공행록』도 2부에 함께 수록했는데, 박태원의 번역문과 주석을 싣고, 저자의 교주가 필요한 경우 보충하되, 최대한 원문 그대로의 맛을 살렸다. 구보의 문장은 지금은 사라져가는 서울말(경아리 말)의 백미를 보여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 최원식은 1949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와 영남대를 거쳐 1982년 인하대로 옮겨 2015년에 퇴임했으며, 현재 인하대 명예교수로 있다.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으로 등단하여, 『창작과비평』 편집주간, 민족문학사연구소 공동대표, 인천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민족문학의 논리』, 『문학의 귀환』, 『문학과 진보』, 『한국근대문학사론』,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문학』 등이 있고, 중역본 『文學的回歸』, 일역본 『韓國の民族文學論』, 『東アジア文?空間の創造』 등이 있다. 대산문학상, 임화문학예술상 등을 수상했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www.lecturernews.com)
-
 9:26
9:26
MattMorseTV
1 day ago $41.57 earnedPam Bondi is in HOT WATER.
57.9K214 -
 16:38
16:38
MetatronGaming
15 hours agoAnno 117 Pax Romana looks INCREDIBLE
85.7K10 -
 3:25:55
3:25:55
DillyDillerson
4 hours agoCAN'T SLEEP | Solo Raids | Trying to level up my workshop | Tips and help are welcome!
12.2K1 -
 LIVE
LIVE
DynastyXL
4 hours ago🔴 LIVE NOW – ARC RAIDING - BADLY! - NEW RUMBLE WALLET - THOUGHTS?
78 watching -
 2:20:13
2:20:13
Side Scrollers Podcast
22 hours agoVoice Actor VIRTUE SIGNAL at Award Show + Craig’s HORRIBLE Take + More | Side Scrollers
77.2K21 -
 LIVE
LIVE
EXPBLESS
2 hours agoShowcasing New Game | (Where Winds Meet) #RumblePremium
45 watching -
 LIVE
LIVE
Boxin
2 hours agolets BEAT! Kingdom Hearts!
44 watching -
 18:49
18:49
GritsGG
18 hours agoI Was Given a Warzone Sniper Challenge! Here is What Happened!
24.4K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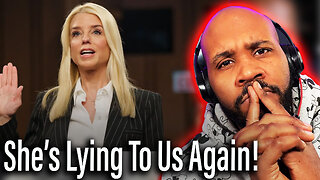 19:02
19:02
The Pascal Show
1 day ago $7.63 earnedNOT SURPRISED! Pam Bondi Is Lying To Us Again About Releasing The Epstein Files
31.2K22 -
 6:05
6:05
Blabbering Collector
22 hours agoRowling On Set, Bill Nighy To Join Cast, HBO Head Comments On Season 2 Of Harry Potter HBO!
27.1K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