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Only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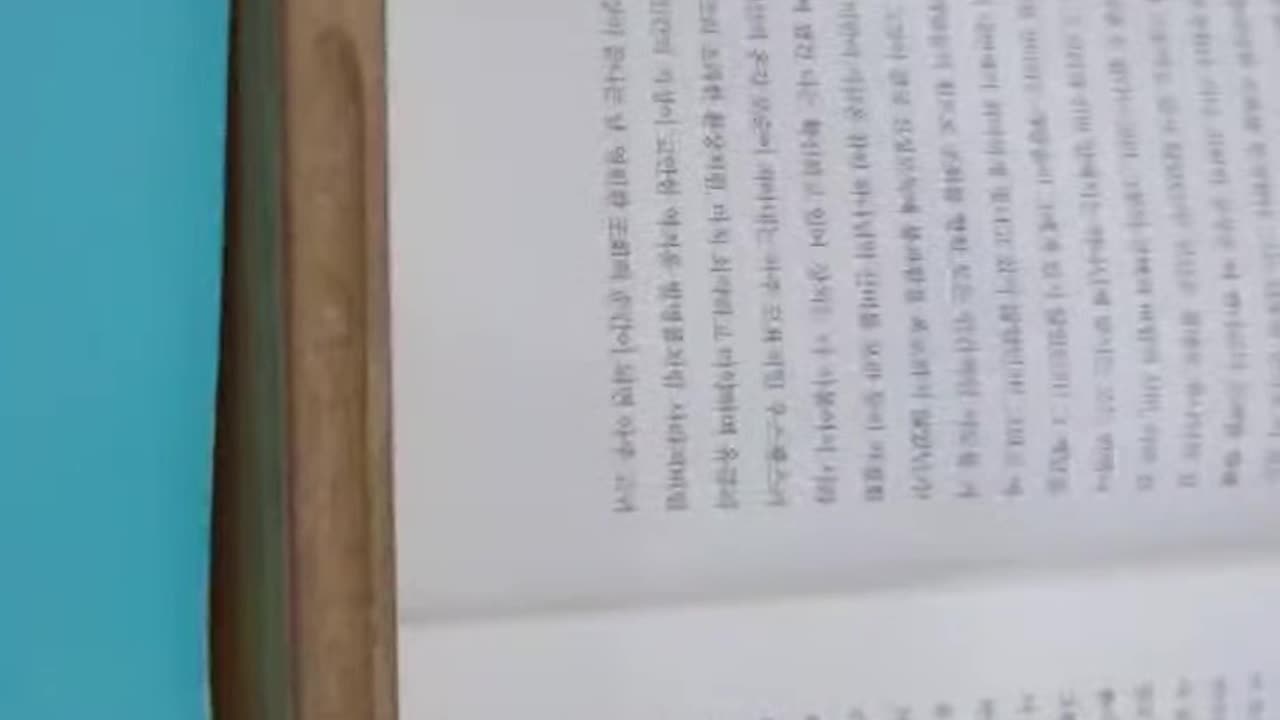
도스토옙스키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학,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종교,고통,복수,용서,포용 ,카리마조프의반항,신랄한고발,미지의해결,이반,무신론자,하나님에대한참된인식,근원
https://www.youtube.com/watch?v=0UTXbhwpvfY&list=PLEAeUfw1DucCWlfAroWZZxbeYA5dCsR--&index=229
에두아르트 투르나이젠
(Eduard Thurneysen, 1888~1974)
스위스의 신학자, 목회자. 칼 바르트와 함께 변증법적 신학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개혁교회의 실천신학을 정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목회상담 영역에서 ‘영혼 돌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이론적인 단초를 놓았다. 약 50년 동안 목회와 신학 연구를 병행하였고 강의와 연구, 저술을 통해 목회 현장과 교단을 부단히 연결하는 작업을 했다.
1888년 스위스 발렌슈타트에서 태어나 목사 집안에서 자랐다. 바젤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종교사회주의 운동에 관여하기도 했다. 1913년부터 1927년까지 로이트빌과 브뤼겐에서 목회했다. 칼 바르트와 함께 변증법적 신학을 소개하는 〈시간과 시간 사이〉〈오늘의 신학적 실존〉을 간행했다. 1927년부터 1959년까지 스위스 바젤 대성당의 수석 목사로 일했고, 그러면서 1929년부터는 바젤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쳤다. 저서로 순전히 이론적인 책보다 설교집이나 교회에서의 실천과 관련된 것이 많다. 주요 저서로는 이 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영혼 돌봄에 관한 가르침》《그분의 손 안에》 등이 있다.
신학이 문학을 경유하여 흥미롭게 전개되는 이 책(원제 Dostojewski)은 20세기 신학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바르트의 《로마서》가 쓰이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정교회 신자였던 도스토옙스키가 개혁주의 목회자 투르나이젠을 통해 자신이 상상도 못했을 방식으로 현대 개신교 신학에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다. 덧붙여 투르나이젠은 도스토옙스키를 좋아해 설교나 강연에서 도스토옙스키 이야기를 빼놓은 일이 거의 없었다는 말도 전해진다.
접기
닫기
목차
제1장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2장 도스토옙스키의 사람들
제3장 도스토옙스키의 관점
제4장 이반 카라마조프, 대심문관, 그리고 악마
제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옮긴이의 글
해제
투르나이젠 연보
접기
추천사
석영중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이 책은 러시아 대문호의 문학과 신학이 하나로 융해되는 거대한 용광로를 보여준다. 구원에 이르는 고통과 용서와 희망의 변증법을 치열한 언어로 짚어낸 저자의 통찰력이 놀랍다. ‘신의 감각’에 다가선 인간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의 독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원전의 깊이에 번역자의 깊이가 더해진 이 우아한 번역본에 경의를 표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극단적인 인물들, 언제라도 하늘로 솟구치거나 지옥으로 추락하는 존재들, 허황된 형이상학적 고민에 사로잡혀 휘청거리며 괴로워하는 인간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 어쩌면 바로 그 양극성이야말로 도스토옙스키 인간관의 총체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려 섞인 눈빛으로 도스토옙스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의 작품에서 드러난 비인간적이고 탈속적인 특성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특성 때문에 싫어하기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둘이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_70~71쪽
미시킨 공작은 왜 백치 취급을 받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계관과 인생관, 인간의 모든 지혜라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질문으로써!)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치는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다. 이것이야말로 백치의 신적인 어리석음이다. _83쪽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건 나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야. 나는 고작해야 이 세상의 유클리드적인 지성을 가진 거야. 어떻게 인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 이것이 무신론자 이반의 질문이다. 참된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 말한다고 할 때, 이 무신론자의 질문보다 강력하고 진실한 말이 가능할까? … 이러한 무신론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무신론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 버린) 교회다.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키고는 있으되 인생의 불가사의함에 대한 질문을 잠재워 버리는 교회다. 그 불가사의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을 증언한다. 이반과 같은 무신론자는 열정적으로 거짓 신을 부정하는데, 이로써 참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세계가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 인해 “유클리드적인 지성, 이 세상의 지성”으로 파악 가능한 신으로 전락하는 것에 저항한다. 그런 신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불가사의함을 풀어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증거물 혹은 얄팍한 위안에 불과하다. 인간은 스스로를 속여가면서 그 불가사의함을 외면하려고 한다. _108~109쪽
톨스토이의 경우 이런 장면은 거의 대부분 인간이 새로운 인생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단계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최고의 위업이 달성되는 곳이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다르다. 치열한 몸부림은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안간힘을 쓰지는 않는다. “회심”이라 부를 만한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아주 자유롭고 세상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일어난다. 이는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의 “회심”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 톨스토이의 작품에서는 필연적으로 경건주의적인 참회의 노력을 떠올리게 된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도 그런 결단과 전환의 순간이 있지만 그것이 회심자와 비회심자의 구분,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의 구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로의 구분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_145~146쪽
그 변화는 어디에서도 목적이나 의도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을 원하거나 요구할 수도 없다. 그저 길가에 피어 있는 꽃처럼 가만히 서 있다. 게다가 그 길은 특별한 성인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다.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의 길도 아니다. 누가 봐도 이 세상의 자녀인 이들, 심지어 죄인과 창녀와 살인자, 불안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언저리에서 피어난다. 용서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은 의인의 길이 아니라 죄인의 길이기 때문이다. _147~148쪽
우리는 도스토옙스키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상에서 이렇듯 엄청나게 돌출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도 고스란히 그의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은, 도스토옙스키 스스로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반항적인 요소를 아주 많이 지닌 채로 살았으며 그것을 그토록 탁월하게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도스토옙스키 본인이 자신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문제적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성자가 아니다. 금욕주의자도 아니다. 고상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악마적인 영혼이다. 그는 톨스토이가 아니다. 도스토옙스키다. 그는 이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는 인간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 그 역시 자신의 인간성을 통한 굴절 속에서만, 오로지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우리의 도스토옙스키이다._155~156쪽
결국 모두의 논문과 무관하지만, 또 동시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투르나이젠의 《도스토옙스키》를 읽기로 했다. 박사과정생의 고된 일상에 부담이 되지 않는 얇은 분량이 모두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무엇보다도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별로 기대하지 않고 시작된 책 읽기 모임이 진행될수록 모두가 점점 투르나이젠에게 설득되어갔다. 결국 모임을 마무리할 때, 한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며 “그래, 이게 바로 신학이지!”라고 외쳤다. 정교하고 치밀한 학술적 신학에 지치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중압감에 눌려 있던 젊은 신학도들에게 이 책은 신학이 무엇이고 신학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다시 일깨워줬다. _183~184쪽, 해제 중
당시 30대 초반의 젊은 목사였던 투르나이젠은 신과 인간의 경계를 지우려는 신학이 야기한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에서 찾았다. 이 저작은 당시 독일어권 신학에서 아직 낯선 이름이었던 도스토옙스키를 발견케 했으며, 현대신학의 이정표가 된 칼 바르트의 《로마서》가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이 책의 메시지는 《로마서》 제2판의 중요한 갈피마다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또한 《로마서》의 방대한 사유와 해석이 이 얇은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
인간의 종교심·문화·역사·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 죄와 용서의 긴장을 잃지 않는 신학을 통해 지옥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실된 위로를 전하며 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커다란 울림을 전한다. 도스토옙스키를 읽었던 독자라면 깊이 있는 신학적 관점에서 작품을 재해석하는 재미를 느낄 것이고, 소설을 읽지 않았던 독자라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핵심부터 맛보게 될 것이다.
20세기 유럽에서 탄생한 ‘우정의 저작’
투르나이젠은 약 5년간의 연구와 토론과 글쓰기를 거쳐 1921년에 현대신학의 최첨단 주제를 발표하는 스위스 아라우 대학생 총회에서 도스토옙스키에 관한 강연을 한다. 같은 해에 바르트는 《로마서》 2판을 탈고하는데, 서문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성서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상가로 도스토옙스키와 키르케고르를 먼저 언급한다. 1933년에 처음 출간된 영어판의 색인을 기준으로 볼 때 《로마서》에서 언급되는 빈도가 가장 높은 인물은 루터도, 칼뱅도, 키르케고르도 아닌 도스토옙스키이다.
이처럼 20세기에 두 신학자의 우정 속에서 탄생했던 책이 백 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서 손성현 목사와 김진혁 교수의 우정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김진혁 교수는 유학 시절 이 책을 처음 읽은 이후로 그 감동과 깨달음을 한국의 그리스도인도 맛보았으면 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때가 무르익었을 때 손성현 목사에게 이 책을 소개했다. 칼 바르트의 《로마서》를 번역하기도 했던 손성현 목사는 이번에 1922년에 출간되었던 독일어판을 소리 내어 읽으며 백 년 전 투르나이젠의 강렬한 문체까지 우리말로 옮겼다. 김진혁 교수는 해제에서 이 저작이 탄생한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풍부하게 짚어줌으로써 우리에게는 비교적 낯선 신학자를 우리 앞에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
 2:23:38
2:23:38
Side Scrollers Podcast
17 hours agoSide Scrollers Podcast Live | Wednesday February 18th 2026
5.72K5 -
 17:23
17:23
Nikko Ortiz
12 hours agoThe President Chose Them Over Delta Force...
3.12K3 -
 21:44
21:44
GritsGG
12 hours agoBiggest Warzone Comeback Victory EVER!
1.32K -
 1:21:58
1:21:58
PandaSub2000
4 days agoFive Dates (Trilogy) | MIDNIGHT ADVENTURE CLUB (HD Special)
16.6K4 -
 19:17
19:17
MetatronHistory
1 day agoCambridge University says Anglo-Saxons didn't exist! DEBUNKED!
2.49K2 -
 4:21
4:21
TruthStream with Joe and Scott
4 days agoHug ~ A lovesong for Humanity written by Joe Rosati and Steve Collins
25.4K19 -
 LIVE
LIVE
Lofi Girl
3 years agolofi hip hop radio 📚 - beats to relax/study to
163 watching -
 2:00:47
2:00:47
Sam Tripoli
2 days ago $5.86 earned#965: BlackRock Bamboozle With Susan Bradford
22.2K15 -
 17:58
17:58
Nikko Ortiz
2 days agoClips That Went Too Far...
43K5 -
 47:33
47:33
The Sam Hyde Show
2 days agoThe Sam Hyde Show: This is War w/ Ken O'Keefe
95.3K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