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um Only Cont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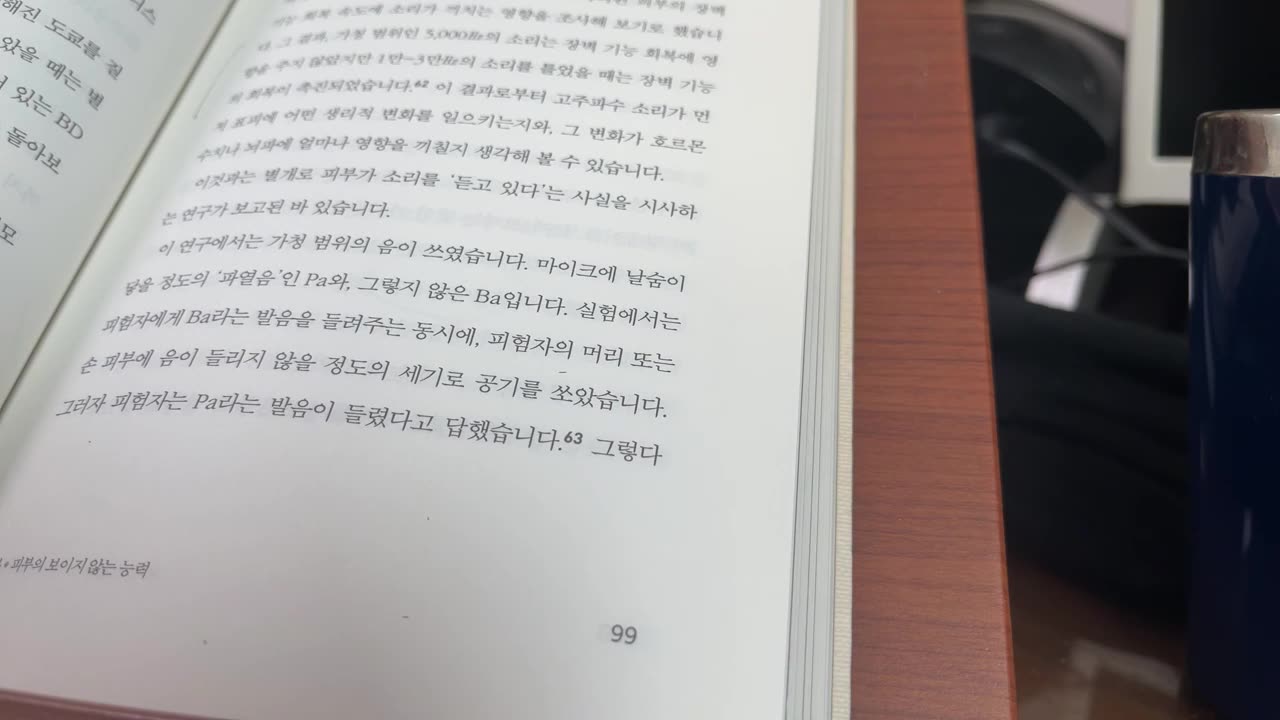
제3의 뇌 놀라운피부,덴다 미츠히로,감각,지각,촉각,진피,신경말단,압점,케라티노사이트,큐티클,비늘,플라스틱판표면,머리카락,과학칼럼니스트,다케우치 카오루,기타노다케시,마이크로미터
『놀라운 피부』는 피부의 ‘놀라운’ 감각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부감각 덕분에 문명이 생기고 다양한 사회의 시스템이 발생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사회 시스템이 결국 다시 인간을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저자는 그에 경종을 울리고 피부감각의 중요성과 원초적 본능으로의 회귀를 논한다. 역사와 철학, 과학, 그리고 예술 사이를 터부 없이 넘나들며 무라카미 하루키, 도스토옙스키, 반 고흐 등 풍부한 역사적, 실제적 사례들을 통해 피부감각과 인류가 그동안 어떻게 연결되어 왔으며, 이 피부감각이 어떻게 인류 역사와 문화,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덴다 미츠히로
저자 덴다 미츠히로(傳田光洋 Mitsuhiro Denda)는 1960년 효고현 고베시 출생. 주식회사 시세이도 리서치센터 주임 연구원.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CREST 연구원. 교토대 공학부 공업화학과 졸업. 동대학원 공학연구과 분자공학전공 석사 과정 수료. 94년 교토대 공학박사 학위 취득.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원을 역임, 2009년부터 현직에 재직 중.
저서로 『피부는 생각한다』(이와나미 과학 라이브러리), 『현명한 피부 - 사고하는 최대의 ‘장기’』(치쿠마신쇼), 『제3의 뇌 ~ 피부로부터 생각하는 생명, 마음, 세계』(아사히출판사), 『피부감각과 인간의 마음』(신쵸센쇼)가 있다.
들어가면서
제1부 경계에 존재하는 지능
뇌가 없는 짚신벌레의 지능 │ 살아 있는 것 같은 로봇 │ 장뇌의 지능 │
리더 없이도 질서 정연하게 행동하는 집단 │ 인간이 만든 조직의 피부 │ 곤충의 미소뇌 │
피부감각이 뇌를 창조하다 │ 피부감각과 뇌의 크기 │ 체모를 잃은 인간
제2부 피부에 대해
피부의 기본 구조 │ 각질층 기능의 본질은? │ 샌프란시스코 유학 시절 │ 마그네슘과 칼슘, 그리고 전기
제3부 피부의 보이지 않는 능력
‘감각’과 ‘지각’ │ 여성의 섬세한 ‘촉각’ │ 피부는 ‘듣고 있다’ │ 피부는 ‘보고 있다’ │
피부는 ‘맛보고 있다’, ‘냄새 맡고 있다’
제4부 피부와 마음
피부는 ‘예지한다’ │ 피부는 ‘생각한다’ │ 기억하는 피부 │ 감촉으로 변하는 인간관계
제5부 피부가 가져온 기능
피부색으로 분간하는 인간의 마음 │ 피부의 지역 다양성 │ 피부감각이 언어를 만들었을 가능성 │
의식은 무엇인가 │ 피부감각 정보의 대부분이 무의식에 작용한다 │ 시라스 마사코의 촉각적 지성
제6부 시스템과 개인의 미래
‘시스템’의 탄생 │ 의식의 어두운 면 │ 무라카미 하루키의 ‘벽과 알’ │ 인터넷의 영향 │
대뇌를 활성화하는 스마트폰 │ 피부감각과 개인의 존재
제7부 예술과 과학에 관해
예술과 과학의 인류사 │ 시스템과 자기애의 딜레마 │ 회귀하는 미술 │ 무의식을 뒤흔드는 음악 │
시스템과 각각의 문자 │ 과학과 인간의 보편
맺음말
감사의 말
참고 문헌
접기
책 속으로
진화라는 건 애초에 우연하게 일어난 유전자의 변화, 그 결과 보다 환경에 적응한 것이 살아남은 현상으로 일컬어집니다. 즉, 우연하게 일어난 체모의 상실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체모가 적은 개체가 살아남았고, 결국 인간은 체모가 거의 없는 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모가 없어지는 경우 어떤 면에서 생존에 유리한 것인가, 그 점을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은 사바나에서 직립을 시작해 두 발로 걸었을 무렵 열에 약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 증발로 몸을 식히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 결과 체모가 방해가 됐다는 학설입니다.
저는 이 학설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직립보행을 시작한 인류의 조상은 뜨겁고 건조한 아프리카에서 살았습니다. 분명 더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겠죠. 하지만 최초에 직립보행을 시작했으리라 추정되는, 350만 년 전에 출현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몸 전체가 털로 덮여 있는 반면 뇌의 크기는 침팬지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만 년 이상 인간의 조상은 체모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물론 직립보행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증발에 의한 냉각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직립보행(350만 년 전)과 체모의 상실(120만 년 전)이라는 두 사건 사이의 엄청난 시간 차이 때문에, 전 뇌의 냉각과 증발을 위해 체모를 상실한 개체가 살아남았다는 학설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체모를 잃은 120만 년 전에 출현한 인류의 조상은, 호모 에르가스테르, 또는 호모 에렉투스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서 체모를 잃은 개체가 살아남았다는 것이 현재로 이어지는 진화의 시작점이었겠죠. 흥미롭게도 이들 종에서부터 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 사실을 바탕으로 전신의 표피가 환경과 맞닿는 것, 즉 ‘피부감각의 부활’이 인류의 생존에 유리한 움직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해서, 이 과정이 뇌의 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있지 않았을까요?
……
시라스 마사코 씨는 훌륭한 작가로서도 유명하지만, 이와 동시에 뛰어난 ‘감정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골동품에 대한 다양한 일화가 남아 있지요.
시라스 씨는 골동품을 꾸미고 보기만 해서는 가치를 알 수 없다, 실생활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 예를 들어 오리베(織部, 일본 모모야마 시대의 다기)나 로산진(北大路魯山人, 일본의 요리 예술가 겸 도예가) 다기로 밥을 먹고 이조백자 술병이나 도자기로 저녁 반주를 들이켜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동안 좋은 품질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시라스 씨의 확고한 의견이었지요.
시라스 씨가 백내장을 앓아 수술을 위해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시각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미술 평론가인 아오야기 케이스케 씨가 문병을 갔을 때, 우연히 네고로유리 그릇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네고로유리라는 것은 와카야마현의 네고로사에서 쓰이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붉은색의 칠기로, 밑바탕에는 검은 옻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검은 부분이 조금씩 보이면서 생기는 아름다움이 귀히 여겨진다고 합니다.
아오야기 씨는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던 그 그릇을 침대 위에 있던 시라스 씨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부자유한 시라스 씨는 잠시 동안 그릇을 만져 본 뒤 “이걸로 괜찮겠어?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오야기 씨는 마음에 두지 않았죠.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에 걸려 확인해 보기 위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역시나 모조품으로 판명이 났다고 합니다. 나중에 수술을 마치고 시력을 회복한 시라스 씨에게 이 건을 말했지만, 시라스 씨는 말없이 미소지을 뿐이었다고 하네요.
전 이 일화는 시라스 씨가 골동품을 일상에서 사용하며 계속 만진 덕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겁니다. 다양한 피부감각, 예를 들어 감촉, 무게, 중심 등도 인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들은 ‘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 『놀라운 피부』 본문 중
접기
출판사 서평
이런 과학자를 만나고 싶었다!
“회사원 주제에 이상한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는
어느 피부 연구자의 피부 시스템론
인간이 ‘헐벗은 원숭이’가 되고 만 운명을 밝힌 ‘이상한’ 피부 연구자의 ‘수상한’ 보고서
인간이 헐벗게 된 이유는?
지렁이나 조개는 피부 표면에 분산되어 있는 광수용체 기관을 가지고 있다. 진화 과정에서 척추동물이 나타나고 육상 생활에 적응하면서 파충류는 비늘로, 조류는 깃털로, 대부분의 포유류는 털로 몸의 표면을 감싸면서 빛도 소리도 피부까지 닿기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인류는 120만 년 전에 체모를 잃어버렸다. 분명 피부를 드러내는 편이 생존에 유리했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화장품 회사 연구원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소유한 피부 연구자 덴다 미츠히로는 『놀라운 피부: 생각하고 맛보고 감각하는 제3의 뇌, 피부』(5월 1일 발행/동아엠앤비)에서 전신의 표피가 환경과 맞닿는 것, 즉 ‘피부감각의 부활’이 어떻게 인류의 발전을 가져왔는지 설명한다.
알려지지 않은 피부의 감각에 관한 이야기
흔히 ‘지능’은 뇌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드넓은 생물 세계를 들여다보면 뇌가 없어도 고도의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존재들이 수없이 많다. 단세포 생물인 짚신벌레는 뇌가 없어도 장애물을 만나면 피하고, 자신의 생명에 관계된 고온, 저온, 극단적인 산성 또는 염기성 물로부터 도망간다. 그리고 먹이가 되는 세균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 잡아먹는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과 행동은 모두 짚신벌레의 ‘피부’에 해당하는 세포막으로부터 비롯된 기능이다.
저자는 피부가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예지하고’, ‘학습하고’, ‘생각하는’ 등의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피부의 역할과 인간의 감각, 뇌 발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본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는 무수한 피부감각이 어떻게 우리의 ‘제3의 뇌’라고 까지 일컬어질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몸을 에워싼 놀라운 또 하나의 지능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미래는 ‘피부감각’에 달려 있다!
이 책은 피부의 ‘놀라운’ 감각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피부감각 덕분에 문명이 생기고 다양한 사회의 시스템이 발생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사회 시스템이 결국 다시 인간을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저자는 그에 경종을 울리고 피부감각의 중요성과 원초적 본능으로의 회귀를 논한다. 역사와 철학, 과학, 그리고 예술 사이를 터부 없이 넘나들며 무라카미 하루키, 도스토옙스키, 반 고흐 등 풍부한 역사적, 실제적 사례들을 통해 피부감각과 인류가 그동안 어떻게 연결되어 왔으며, 이 피부감각이 어떻게 인류 역사와 문화,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한다. 실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라운’ 과학자의 ‘놀라운’ 책이다.
-
 LIVE
LIVE
The Rubin Report
1 hour agoPress Goes Silent When Told Ugly Facts of Damage Done by Democrat Shutdown
1,684 watching -
 LIVE
LIVE
Dr Disrespect
1 hour ago🔴LIVE - DR DISRESPECT - ARC RAIDERS - NORTH LINE UPDATE
922 watchin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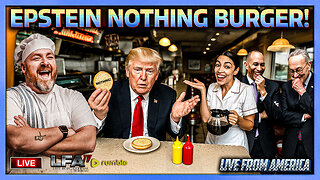 LIVE
LIVE
LFA TV
14 hours agoLIVE & BREAKING NEWS! | THURSDAY 11/13/25
3,988 watching -
 LIVE
LIVE
Nikko Ortiz
1 hour agoVETERAN DAY FAILS... | Rumble LIVE
109 watching -
 UPCOMING
UPCOMING
The Mel K Show
41 minutes agoMORNINGS WITH MEL K - Peak Manufactured Hysteria as Epstein Boomerang Returns - 11-13-25
1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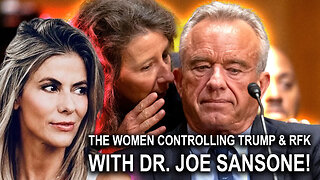 UPCOMING
UPCOMING
The Shannon Joy Show
1 hour agoEpstein Emails Released - Trump Implicated! Susie Wiles & Stefanie Spear - The Women Controlling Trump & RFK * The Psychology Behind The Psyop - Live Exclusive W/ Dr. Joe Sansone!
112 -
 UPCOMING
UPCOMING
Grant Stinchfield
13 minutes agoThe Deputy Who Stood Up and Got Taken Down... Only Gov. DeSantis Can Help This Hero Now!
-
 1:03:48
1:03:48
VINCE
3 hours agoDems' Shutdown Is Gone. Now They've Revived Epstein | Episode 168 - 11/13/25 VINCE
163K54 -
 LIVE
LIVE
Badlands Media
10 hours agoBadlands Daily: November 13, 2025
3,898 watching -

Simply Bitcoin
19 hours agoThe Bitcoin Crucible w/ Alex Stanczyk & Tomer Strolight - Episode 8
5.81K1